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시민을 생각하지 않는 현수막은 또 하나의 폭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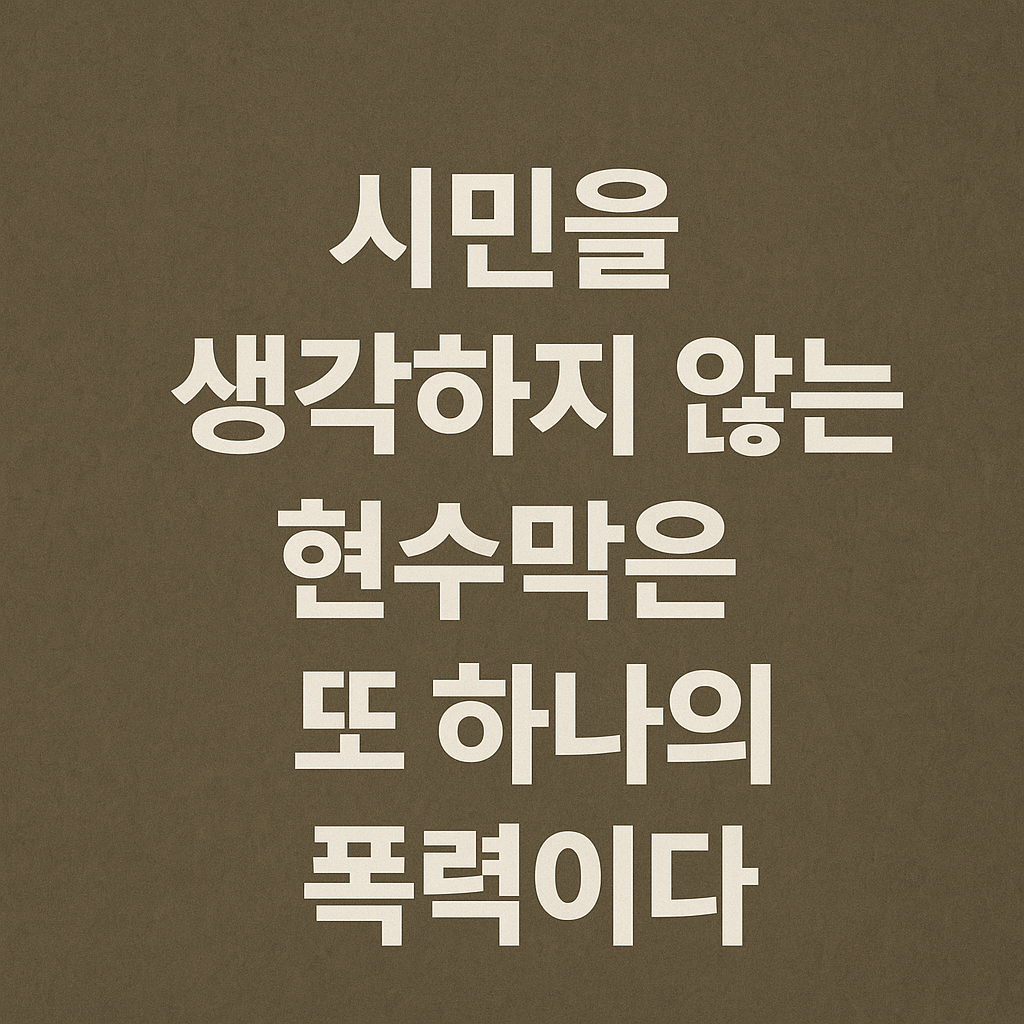
– 현수막 민주주의에 묻는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동네가 아파진다. 아침에 눈을 뜨고 거리를 나서면, 전봇대마다, 인도마다, 심지어 신호등 기둥 위에도 온통 정당과 후보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그 모습이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면, 왜 시민은 매번 이렇게 피곤하고 짜증이 날까?
우리는 묻고 싶다. 정치인이 걸면 다 허용되는 이 ‘현수막 특권’은 누가 만든 규칙인가. 기업이 광고 현수막 하나 걸려면 지자체 심의부터 허가 절차까지 수없이 거쳐야 한다. 하지만 선거철 정치인은 어떠한가. ‘공직선거법’이라는 보호막 아래, 무제한에 가까운 자유가 보장된다. 시민의 시야를 가리고, 도로 안전을 위협하며, 주거지 앞에 사생활을 침범하는 이 현수막들에 왜 우리는 침묵해야 하는가?
정치가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라면, 적어도 그 정치적 행위는 시민의 일상 속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누군가에게는 퇴근길의 스트레스고, 누군가에겐 밤잠을 설치게 하는 침입일 수 있다. 어떤 이는 운전 중 가려진 신호에 놀라고, 어떤 이는 자녀가 보는 창밖 풍경에 실망한다.
그리고 더 마음 아픈 건, 현수막 속 비방하는 말, 부정적인 문구를 매일같이 눈에 담아야 하는 피로감이다. 시민은 갈등과 혐오의 문장을 보기 위해 거리를 걷는 것이 아니다. 가끔은 가로수 사이에 “오늘도 수고했어요” 같은 한 줄의 긍정적인 문장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가. 왜 선거철만 되면, 그 반대의 말들로 도로와 도시를 도배해야 하나? 이건 결국 도시의 품격에 대한 문제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주민에 대한 예의에 관한 문제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현수막 정치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법과 제도 차원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공직선거법을 손봐야 한다.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와 수량에 제한을 두고, 생활권이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구간은 ‘설치 금지구역’으로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더불어 전통적인 방식의 홍보에서 벗어나 SNS, 문자, 유튜브 같은 디지털 선거운동을 유도하는 것이 더 친근하고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둘째, 선거 현수막도 일반 광고물처럼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심의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공간을 사용하는 만큼, 민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민감 지역은 자동으로 제한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현수막 총량제를 도입하거나 일정 수준의 광고세를 부과해야 한다. 후보자별로 일정 수량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공공 공간을 사용하는 데 따른 선거공간사용료를 매김으로써 무분별한 설치를 줄일 수 있다.
넷째,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선관위가 협업해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불편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법과 규칙, 조례는 정치인의 손에서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시민도 조례 개정과 입법 제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국회에는 국민청원을, 지자체에는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우리는 제도 그 자체를 바꾸는 힘을 행사할 수 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현수막 제한 조례가 부분 시행되고 있으며, 그 출발점은 시민들의 문제의식이었다.
정치가 시민을 설득하려면, 먼저 시민의 눈과 귀, 그리고 일상을 존중해야 한다. 주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현수막을 남발하는 것 또한, 하나의 ‘정치적 폭력’이다. 그것은 물리적이지 않아도, 시각적이고 정서적인 압박이다. 그 첫걸음은 불법과 편법에 가까운 현수막 정치의 종식이다. 시민은 현수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보고 싶다.






댓글 영역